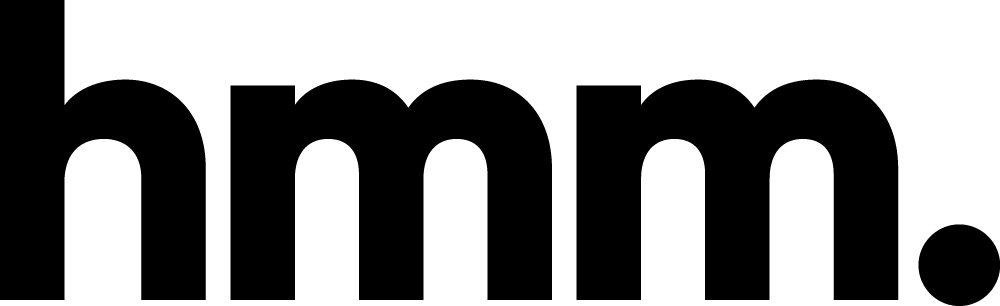꿈을 꾸는 그대들은 누군가의 꿈이다
굿바이 홈런(이정호, 2013), 힘내라! 미라클 – 독립야구단 ‘연천미라클’ 72시간(KBS, 2017), 나는 프로다 – 프로야구 2군 선수단(KBS, 2011)을 통해 바라본 고교 야구, 독립야구, 그리고 프로2군
공 하나에 추억과, 공 하나에 동경과, 공 하나에 꿈
타자가 때려낸 공이 담장을 넘긴다 하여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이건 헛스윙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지도, 누군가의 병이 낫지도 않는다. 주자가 홈플레이트를 밟는다 하여 어딘가의 싸움이 멎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환호한다. 자신과는 일면식도 없는 이들이 ‘단순한 공놀이’를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또 감동에 눈물짓기도 한다. 환호성과 열기로 가득한 그라운드를 누비는 이들. 그들은 프로야구 선수들이다.
그러나 모든 반짝이는 것에는 이면이 있다. 이들도 예외는 아니다. 화려한 플레이를 선보이며 부와 명예를 얻는 선수들은 어느 날 하늘에서 똑 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번데기였고, 애벌레였으며, 스스로의 알을 깨고 나오던 날이 있었던 존재였다. 그렇지만 나비가 되지 못한 이들은? 혹은 나비가 되었더라도, 찬란히 날지 못한 이들은? 알을 깨지 못한 작은 애벌레, 깨어난다는 기약 없이 잠자고 있는 번데기, 한 번 날개를 펼쳤으나 힘없는 날갯짓으로 삶을 버텨내야 했던 나비. 본 칼럼은 이들에게 헌정하는 글이다.
10%의 ‘기적’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교 야구의 열기는 그리 뜨겁지 않다. 프로야구 팀들이 지역연고를 기반으로 팬을 꾸린 탓에 지역 팬들의 응원도 적고, 일본처럼 청춘과 낭만의 상징인 ‘고시엔’ 같은 큰 대회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프로에 오는 선수들은 모두 한때는 고교 야구 선수였다.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이다.
고등학교 야구부에서 프로 리그에 진입하는 졸업생들은 매해 10% 정도이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디로 가는가? 운이 좋으면 대학에 진학해 다시금 드래프트를 노린다. 어쩌면 프로팀의 육성군에 들어가 기회를 엿볼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개는 야구를 그만둔다. 이정호 감독의 영화 ‘굿바이 홈런(2013)’은 이러한 현실을 잘 이야기해 준다. 원주고등학교 야구부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인 ‘굿바이 홈런’의 결말은 해피엔딩이 아니다. 프로에 지명받은 이는 아무도 없었으며, 주장인 정지민을 포함한 많은 선수들은 야구를 포기했다. 그리고 말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본 이들만이 뱉을 수 있는, 가장 씁쓸하고도 아름다운 한 마디일 것이다.
꿈이라는 한 글자를 위하여
야구선수는 ‘직업’이다. 그들에게 야구장에 가는 것은 ‘출근’이고, 경기를 뛰는 것은 ‘일하는 시간’이다. 즉, 돈을 받고 하는, 나름의 생산적인 공놀이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직접 돈을 내고 해야 된다면 어떨까. 그것은 더 이상 직업이 아니다. 누군가는 취미라고 할지도 모르는 일. 독립야구 선수들은 이것을 ‘꿈’이라고 부른다.
프로야구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숙소와 경기장, 온전히 야구에 집중하지 못하고 훈련이 없는 날이면 알바를 뛰어야 되는 삶. 나의 노력을, 열정을, 실력을 누군가는 알아봐 줄까 확신할 수도 없는 나날들을 속에서, 독립야구 선수들은 오늘도 땀을 흘린다. 이것이 2017년, KBS 다큐멘터리 3일에서 방영한 ‘힘내라! 미라클 – 독립야구단 ‘연천미라클’ 72시간’의 선수들을 포함한 많은 독립리그 야구선수들의 현실이다. 프로로 진출한 소수의 독립야구 선수들을 희망이자 목표로 삼고 노력하는 이들의 초상이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 희망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서른 이후로는 매년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기량 저하를 걱정해야 하고, 마땅한 생계활동도 없는 이들에게 꿈을 향한 유예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 이는 프로에 가지 못했든, 갔으나 방출되었든 마찬가지다. 그들은 그저 유한한 시간과 기회 속에서 치열하게 발버둥 칠뿐이다. ‘꿈’이라는 짧고도 묵직한 글자를 가슴에 새기고서.
Professional-ish
‘프로야구 선수인가? 그렇다. 야구로 돈을 벌어 사는가? 그렇다. 팬들은 이들을 기억하고 응원하는가? …글쎄.’ 이 마지막 질문에 고개를 갸웃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프로야구 2군 선수단일 것이다. 이들은 앞서 언급된 두 부류의 선수들보다 어떤 면에선 훨씬 유복하다. 고등학교 졸업 선수의 10% 정도에게만 허락되는 프로 리그에 진출했으며, 야구로 먹고 살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은 또다시 꿈을 꾼다. ‘1군’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꿈을.
프로야구 팬들이 떠올리는 선수들은 대개 1군의 주전들이다. 세 자릿수 등번호를 달고 뛰는, ‘언젠가’ 촉망받는 선수가 될지 모를 이들은 대개 관심 밖이다. 소위 ‘찐팬’이라 하는 이들도 1군 경기를 챙겨보듯 모든 2군 경기를 관전하고, 그 기록을 살피는 이는 많지 않다. 2011년, KBS에서 전파를 탄 ‘나는 프로다 – 프로야구 2군 선수단’ 다큐멘터리의 2군 선수들은 그런 이들이다.
2군 선수들은 스스로 빨래를 한다. 라커룸은 경기장 밖의 공터이며, 볼보이는 신입 선수가 담당한다. 비록 다큐멘터리에 담긴 것이 십여 년 전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1군과 2군, 숫자 하나 달라졌을 뿐이지만 그 차이는 실로 어마어마하다. 많은 동료들이 꿈꿔온 세계에 들어선 이들이지만, 그 실상은 녹록치 않다. 다 온 줄 알았더니, 머릿속에 그리던 무대로 가기까지는 하나의 관문이 더 남아 있었던 것이다. 유망주가 노망주*가 되기까지는 순식간이다. 그렇기에 이들은 치열하게 스스로를 갈고닦고, 채찍질한다.
누군가는 물을지 모른다. 결국 그곳이 마지막이 아니냐고, 더 나아갈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당시 2군의 신참이던 SK 박종훈은 PD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
언제 핵잠수함**이 될 것 같아요?
그는 답했다.
이제 스위치만 누르면 돼요.
그리고 그는 현재, KBO 리그를 대표하는 언더핸드 투수로 거듭났다.
글을 마무리하며
어릴 적에는 누구나 꿈을 이야기한다. 미용사, 과학자, 대통령을 비롯해서 온갖 직업의 이름을 불러대며 조잘거린다. 그리고 조금 크면, 그 꿈은 대개 ‘사’ 자로 끝나는 직업이나 선생님, 공무원으로 바뀌기 일쑤다. 나중에는 꿈에 대해 생각하지도, 묻지도 않는다. 직업과 꿈이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을 안 이후부터는, 원하는 것만 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부터는 꿈이란 말을 입에 담지도 않는다. 꿈과 현실의 괴리를 이해해버린 탓이다.
무미건조하고 흔해빠진 ‘대학’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아는 고교 야구 선수들은 꿈이다. 고교 야구 선수들에게, 실패에 굴하지 않고 프로에 도전하며 계속해서 목표를 좇는 독립야구 선수들은 꿈이다. 독립야구 선수들에게, 1군에서 제 실력을 보여줄 날을 고대하며 준비하는 프로 2군 야구선수들은 꿈이다. 프로야구 1군 선수들에게도 이러한 꿈의 연쇄 관계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 보라. 지금 그들이 있는 위치는, 누군가의 목표고 동경의 대상이다. 꿈을 이루지 못했다 하여 스스로를 폄하할 이유는 없다. 비하 받을 이유도, 없다.
자부심을 가져라. 꿈을 꾸는 그대들은 누군가의 꿈이다.
==각주==
*노망주: 한때 기대를 모은 선수였으나 재능을 꽃피우지 못한 채 나이가 든 선수
**핵잠수함: 언더핸드로 던지는 투수(잠수함) 중 실력이 뛰어난 선수